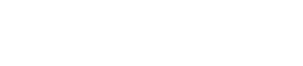이혼통계의 허와 실
| 조회수 | 731 | ||
|---|---|---|---|
|
대 학 시절 사회통계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숫자는 불신도 곤란하나 맹신도 경계해야 한다. 통계는 일단 돌리면 결과는 무엇이든 나온다. 단 쓰레기를 넣으면(garbage in) 쓰레기가 나온다(garbage out)는 사실을 잊지 말 것.” 지난 3월 27일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30만6573쌍이 결혼하고 14만5324쌍이 이혼함으로써 이혼 건수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한다. “매일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 꼴로 갈라서는 셈”이라는 친절한 해석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혼한 쌍/결혼한 쌍’ 비율이 무려 47.4%로 나타났다. 자칫하다가는 100쌍 중 47쌍 가량이 이혼하는 건 아닌가, 우려에 빠질 수도 있겠다. 물론 이 경우 이혼 연령은 분산되어 있는 반면 결혼 연령은 집중되어 있기에 분자 분모를 구성하는 모집단의 크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혼 쌍/결혼 쌍 비율은 이혼율 크기를 과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옴을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결혼한 커플을 5년 동안 추적하여 그들이 이혼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략 3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100쌍 가운데 38쌍 정도가 5년 이내에 이혼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선 결혼한 커플을 추적하여 이혼율을 추정해본 사례는 현재로선 없다. 한 가지,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한 뒤 갈라서는 ‘늦은 이혼’이 10년 전의 3300건에서 2만2800건으로 급증했음”은 눈길을 끈다. 이 경우에도 40대 장년층 부부가 베이비 붐 세대의 일원이라는 연령 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늦은 이혼’이 ‘일시적·과도기적 이변’인지 아니면 ‘전형적 유형’으로 정착될 것인지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혼 커플의 감소와 관련해서도 새겨 볼 대목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UN에서 선정한 독신율(45세 이상 인구 중 결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인구비)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임을 고려할 때, 결혼 건수 감소가 이른바 결혼적령기 인구집단 자체의 감소 효과인지, 아니면 결혼 시점의 연기 효과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혼 남자+재혼 여자’와 ‘재혼 남자+재혼 여자’의 결혼 비중이 지난 10년 사이 각각 2.7%에서 5.6%, 5.0%에서 11.6%로 두 배 이상 높아졌음은 다소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물론 여성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너그러워진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나, 초혼 남자+재혼 여자 커플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군(郡) 읍(邑) 지역이라는 사실은 ‘농촌총각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 통계는 동일한 자료를 놓고도 정반대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숫자를 둘러싼 해석이야말로 미묘한 정치적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1980년대, 동일한 인구 센서스 자료를 놓고 한 학자는 계급의 양극화 현상을, 다른 학자는 중산층의 확대를 주장했음은 이의 좋은 예이다. 이혼율의 증가를 놓고도 현재 가족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는 진단과 불행한 결혼을 청산하고 제2의 기회를 모색하는 가족의 재구조화라는 견해가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혼이 문제라면 진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깊이 성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혼이 보편화된 서구에서는 이제 이혼의 최대 희생자가 자녀라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단기적 효과 및 장기적 영향, 자녀가 몇 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가 여부, 이혼부부의 자녀양육 및 교육을 둘러싼 책임과 의무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음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어줄 것이다. 통계의 마술에 걸려 현실을 왜곡 인식하기보다 통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고 교묘히 감추고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읽어내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몫인 듯하다.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
| 이전글 | 신세대 부부 혼인신고 미뤄..이혼에 대한 불안감에. |
|---|---|
| 다음글 | 첫날밤을 위한 준비 |